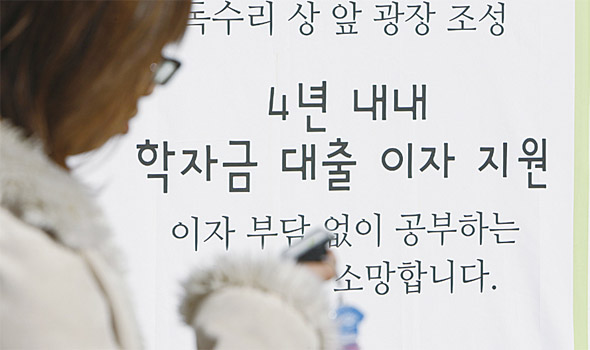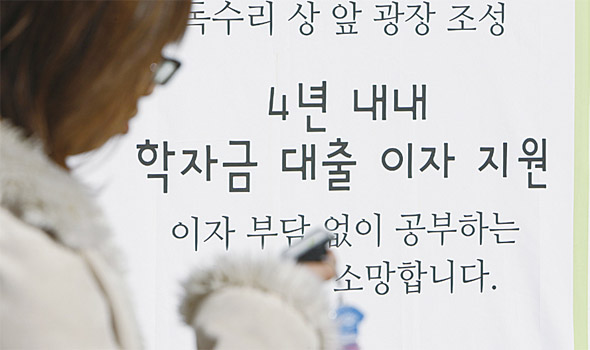등록 : 2013.04.04 15:41
수정 : 2013.04.04 15: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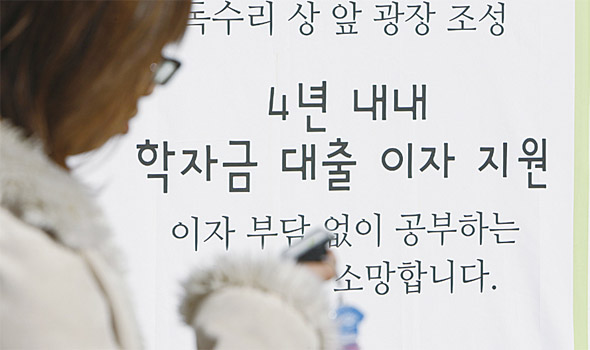 |
|
한 대학 교정에 붙은 총학생회장 후보 선거 벽보. 대학 졸업생 10명 가운데 3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는 현실에서 내 집 마련, 자립의 꿈은 멀어져간다. 한겨레 김정효 기자
|
아버지는 7남매 중 장남이다. 제사를 지내는 우리 집은 명절이면 친척들로 붐볐고, 사촌들이 하나둘 태어나며 그 수는 30명에 가까워졌다. 아버지는 항상 제사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넓은 집을 원했다.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고, 그 반대의 경우가 되면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집을 가장 먼저 처분했다. 형편이 집값에 따라 좋았다 나빴다 하다 보니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일이 반복되었다. 집 평수의 상승·하강 곡선도 하향선을 타기 마련이었다.
그나마 집을 사고파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전, 부동산의 가격 차이가 적을 때 이야기였다. 많은 가계가 그러했듯이 IMF 이후로 가계는 많이 어려워졌고, 부모님은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3평(109㎡) 아파트를 팔고 다시 이사를 계획했다. 이즈음 둘째이자 막내인 내가 대학에 진학해, 부모님은 주거지 위치 선정을 하는 데 부담이 줄었다. 이사 범위는 기존에 살던 마포·서대문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다.
서대문-잠실-남양주-은평-인천-분당
1999년, 처음 이사한 곳은 잠실 주공 1단지였다. 1976년 완공된 이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건물에 10평(33㎡) 안팎인 작은 집이었다. 조경수로 심은 은행나무들은 아파트보다 키가 컸지만, 집 안의 나무로 된 문지방은 삭아서 무너져내려 있었다. 또 뜨거운 물이 겨우내 나오지 않아 물을 데워 목욕해야 했다.
평수를 확 줄이고 보유 구조를 바꿨음에도 집안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고, 이듬해 2000년에는 남양주시로 이사를 가야 했다. 차산리라는 지명의 그야말로 시골 동네였다. 다행히 마을 입구에 서울 청량리까지 가는 버스종점이 있었고, 얼마간 이 버스를 타고 통학했다. IMF의 그림자를 서서히 벗어나고, 서울 가는 버스가 다니던 남양주 지역에도 아파트 개발 바람이 불던 때다. 평내·호평·마석 일대에는 서울에서나 볼 법한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고, 마을 입구에는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놓고 있었다.
부모님이 부동산의 중요함을 인식한 시기도 이즈음이었다. 부모님이 소유했다 잃은 것 가운데 가장 극적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한번 오른 부동산의 가격과 고비 때마다 수차례 떨어진 우리 가계 자산의 차이는 컸다. 그동안 쉽게 사고 팔던 집을 이젠 쉽게 살 수 없게 됐다. 그전에 실제로 보유했던 집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기사 전문은 <나·들> 인쇄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글·스몰엠파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