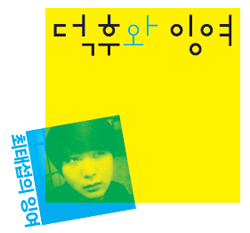등록 : 2013.09.01 16:29
수정 : 2013.09.02 13:50
1970년 11월 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온몸에 ‘불을 짊어진’ 사람이 나타난다. 타오르는 불 속에서 그가 외친 것은 고통의 비명이 아니라 놀랍게도 ‘말’이다. “근로기 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그는 자신을 포 함해 세상으로부터 생매장당한 존재를 세상에 알리기 위 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제물로 삼았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 군부독재정권의 억압적 통치와 근대화를 위한 속도전 이 지배하던 한국 사회에 ‘노동자’라는 주체가 등장한다. 노 동자는 놀랍게도 우리와 같은 피와 뼈로 이루어진 사람이 며, 지나치게 과로하거나, 너무 적은 임금을 받거나, 굶주리 거나, 팔다리가 잘려나가면 사람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런가 하면 몇몇 이들에게 전태일의 죽음은 노동자야 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존재이며, 역 사의 진정하고 정당한 주인이라는 진실이 열리는 사건이었 다. 전태일을 따라 목숨 걸고 노동자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죽음으로 그 뒤를 이은 사람도 많았 다. 이렇게 전태일의 죽음은 하나의 주체를, 하나의 투쟁을 열어젖힌 사건이었다.
전태일의 죽음과 성재기·노무현의 죽음
그리고 우리는 얼마 전 ‘황망하다’는 단어 말고 딱히 표 현할 길 없는 이상한 죽음을 목격했다. 남성연대 대표 성재 기씨의 죽음이다. 그는 어떤 피해망상의 체계와 과장된 남 성성을 하나의 작은 단체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결 국 성 대표를 사지로 몰아넣었다. 사람들에게 남성연대 운 영비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호소하던 그는 얼떨결에 서울 한 강 마포대교에서의 투신을 약속했다. 성 대표의 주변에는 19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수면이라도 지면과 다름없 는 충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그의 투신 결심을 진지하게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성 대표의 측근이라고 주 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투신이 가져올 이러저러한 반 향만 관심사였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중계되는 자살’이라 는 기괴한 엔터테인먼트이며,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관심 밖의 일이었다. 결국 성 대표는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렸고, 장마로 불어난 흙탕물을 따라 이리저리 떠다니다 사흘이 지나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뒤늦게 성 대표의 죽음을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 며 이른바 ‘역차별’에 저항하는 정치적 죽음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런데 그런 목표 변경을 받아들인다 해도 그의 죽음은 여전히 이유가 묘연하다. 공신력 있는 거의 모 든 지표가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여성의 지위를 증명하는 한국 사회에서 대체 성 대표가 바란 것은 무엇인가? 그는 더치페이를 위해 몸을 던졌단 말인가? 애도하기에 한없이 애매한 성 대표의 죽음은 설상가상으로 그의 ‘측근’이라 주 장하는 몇몇 사람에 의해 능숙한 어부의 손에 해체되는 물 고기처럼 ‘분배’되었다. 그 와중에 성 대표의 측근들 간 다 툼도 있었다. 이렇다 저렇다 해도 그의 죽음을 둘러싼 정황 은 하나같이 당혹스럽다. 어떤 사람은 두 죽음을 동일한 것 이라 억지를 부렸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두 죽음은 정확 한 대척점에 서 있다. 한 사람의 죽음은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의미로 가득한 것이라면, 다른 한 사람의 죽음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의문이 들 만큼 의미 없는 황망함으 로 가득하다.
여기에 하나의 죽음을 더해보자. 가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그의 죽음과 전태일의 죽음을 동일시한다. 그러나 노무현의 죽음을 불러온 것은 그가 휘말리고 일부분은 만들어낸 정쟁 게임이었다. 노무현의 죽음은 다른 누군가를 위하거나 어떤 주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차라리 희생양적인 죽음에 가까운 것이다. 냉정하게 따지면 노무현의 죽음은 온전히 그를 위한 죽음이었다. 노무현의 죽음은 100만 명에 가까운 조문객과 끊임없이 “광장으로!”를 외치는 지지자를 만들었다. 하지만 2002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열망과 기대에 비교하면 오늘날 그에 대한 지지는 오히려 퇴행에 가깝다.
노무현의 죽음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그가 죽음에 대해 남긴 인상적인 말 때문이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은 노동자의 분신과 투신이 이어지자 “지금같이 민주화 시대에 노동자의 분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의 최후를 떠올리면 참으로 얄궂게 느껴지는 이 말은, 그러나 어떤 진실을 담고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자분이신” 이 민주화 시대에 과연 어떤 죽음이 전태일의 죽음과 같은 ‘사건’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기사 전문은 <나·들> 인쇄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필자 최태섭의 군 입대로 ‘덕후와 잉여’ 연재를 마칩니다.
글 최태섭 문화평론가. 팔자에 없을 것 같던 글과 말을 업으로 삼은 이후 매일같이 ‘멘붕’(멘탈붕괴)에 빠져 있다.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 <우파의 불만> <트위터, 그 140가지 평등주의> 등을 공저했으며, 현재 ‘잉여’를 주제로 책을 집필 중이다. 성공회대 대학원 사회학 박사과정에 있다. 이런저런 매체에 글을 쓴다. 장래 희망은 먹고살기.